양재규의 Law119
광고주가 직접 물어보고, 법적 전문가의 고견을 들어보는 [Law119].
양재규 언론법 전문 변호사와 함께 광고, 홍보, 마케팅 등 기업 업무 전반에서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①무리한 기자의 취재 방식,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②무례한 취재는 경고로, 위법한 취재는 단호히

용감무식함(?)이 기자 정신으로 간주되던 시절이 있었다. 신임 경찰서장 집무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들어갔다는 어느 기자의 이야기가 무용담처럼 회자되곤 했다. 그럼 현재는? 과거의 잔재가 일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이 달라졌다. 물론, 더 달라져야 한다. 언론계 내부적으로도 정당한 취재방식에 대한 진지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Q) 언론의 취재방식이 비상식적이고 무례하다는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무런 사전협의나 조율도 없이 오너 자택 앞에서 ‘뻗치기’를 하거나 파파라치마냥 집요하게 들러붙는(!) 기자들은 홍보팀으로서 정말 큰 골칫거리다. 이러한 방식의 취재를 과연 어디까지 용인해야 할까?
A) 범죄수사 방법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 임의수사와 강제수사다. 임의수사는 수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이다. 바람직해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등 우리가 떠올리는 거의 모든 수사는 강제수사로서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이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추적한다는 점에서 수사와 취재는 여러 면에서 닮아있다. 결정적인 차이라면, 언론의 취재에는 강제성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안 만나고 싶어 하는 취재원에게 만남 내지 진술을 강요할 방법을 기자는 가지고 있지 않다.
사건의 진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장소가 하필 공개되지 않은 사적 공간이라면 기자는 거기에 합법적으로 들어가기 어렵다. 과거에 ‘동행취재’라는 명목으로 기자들이 수사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현장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모두 위법한 관행이었을 뿐이다.
취재원으로서 용인해야할 취재방식의 범위를 확정하기에 앞서 다소 장황하게 언론 취재의 본질적 한계를 언급한 것은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갈등 내지 충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을 대함에 있어서 ‘불가근불가원’이라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는 기업 홍보담당자로서는 기자들의 무례한 취재방식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무리한 대응 내지 그로 인한 역풍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취재원이 응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신사적인 기자라면 당연히 취재원의 생각이 바뀌기를 기다릴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자는 현실에서 흔하지 않다. 기자들은 보통 인내심이 부족하다. 마감의 압박에 시달린다. 기자 개인으로서는 좀 더 기다려보고 싶어도 데스크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취재원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뻗치기를 하고 있던 기자를 SNS를 통해 비판한 적이 있었다. 오죽하면 그랬겠냐는 우호적인 의견도 있었지만, 지나친 대응이라는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논란조차 정치인에게는 또 다른 의미의 기회일 수 있지만 기업으로서는 가급적 부정적 이슈를 안 만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다.
다음원고에서는 일반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용인될 수 없는 취재방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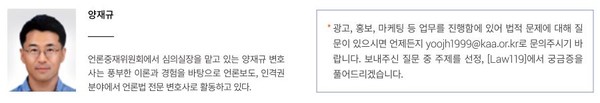
<무례한 취재는 경고로, 위법한 취재는 단호히> 기사로 이어집니다.

